기록하는 사람들 : 기록행 INTERVIEW
서울링 VOL.1
청계천을 기록하며 배운 시민의 힘
-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활동가 안근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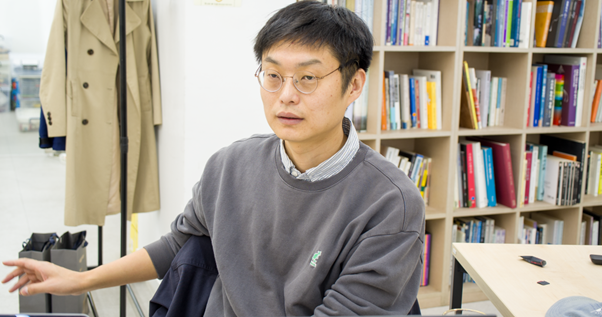
안근철은 청계천 을지로의 철거 현장에서 시민운동과 아카이빙을 동시에 경험한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다.
원래 도시 기록 일을 하던 그는 2019년 청계천 재개발 지역 철거가 시작되면서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초동 모임에 참여하게 됐다. 천막이 쳐지고 아시바가 올라가는 순간순간을 기록하며, 그는 '기록만 하면 뭐하나, 다 없어지는데'라는 상실감을 느꼈다. 때로는 기록이 오히려 개발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되기도 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달랐다. "이번에는 철거가 안 되게끔 하는 목소리를 내보고 싶었다. 철거해도 조금이라도 남기게끔 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현장에 뛰어들었다. 금속 가공업자들과 관계를 맺고, 집회를 조직하고, 사전협의체를 활성화시키며, 그는 '작은 변화라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현재 도시연대 사무실에서 장소 기억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민간 기록 수집에 힘쓰고 있는 그에게, 기록은 단순한 보존이 아니라 변화를 만드는 행위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청계천 재개발 지역 철거되면서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초동 모임이 있었어요. 거기 참여하면서 조금 더 제대로 시민단체 활동을 한 것 같아요.
집회나 행정에 민원 제기하거나, 청계천 지역 소상공인분들이랑 같이 조직해서 집회하는 본격적인 활동은 그때 처음 했습니다. 그전에는 사실 '시민의 힘'이라고 해야 할까, 그런 걸 잘 몰랐는데 그때 활동하면서 보니까 뭔가 많이 변하더라고요. 실제로 요청하거나 주장하는 대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활동이 되게 중요하구나, 사회를 조금이라도 변화시키는 게 있구나 생각하게 됐어요.
그 전에는 도시 기록 쪽 일을 하긴 했었는데, 그냥 일 위주로 했었고요. 시민 활동이랑 연계해서 한 거는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원래 기록하기를
좋아하셨다고 들었는데,
언제부터 기록에 끌리셨나요?
제가 그런 말을 했나요? (웃음) 제가 기록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일기 많이 쓰고 일상적으로 자기 기록하는 스타일은 아닌데요. 근데 습관적으로 잘 못 버리고 못 버리는 편이긴 해요.
저는 좀 뭔가를 모으거나 하면, 집에서도 그렇고 컴퓨터도 그렇고, 뭔가 특성별로 분류해서 보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규칙대로 만들고 싶은데 좀 게을러서 그렇게는 못하는데, 그 규칙이 제 눈에는 보이지만, 제 머릿속에는 확실히 분류돼 있는 것 같아요.
단순한 수집과
기록 활동의 차이를
언제 느끼셨나요?
일을 하다가 서울기록원 중심으로 기록학 분들을 만나게 됐어요. 둔촌주공아파트 현장 수집할 때 기록원에서 도와주러 오셔서 만났는데, 그때 기록학이라는 것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들었던 생각은 '영구 보존' 개념이에요. 기록이라는 게 지금만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남겨야 된다는 거죠. 그게 기록 활동을 한다는 것과 단순 수집의 차이인 것 같아요. 영구 보존을 생각하고 하느냐 안 하느냐. 섣불리 수집만 하는 건 좋지 않더라고요.
청계천도 수집은 했는데, 박물관이나 기록원에서 받아줄 상황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사비로 컨테이너 창고에 넣어놓은 상황인데, 저도 여력이 안 되면 그런 게 없어지는 거죠. 능력이 없는데 무턱대고 보존 수집만 하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좀 더 오랫동안 보존하고 남길 수 있게 기획된 상태에서 수집하는 게 기록과 연결시킬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건축물 철거는 부피도 나가고 무게도 나가니까, 예산이건 사람이건 더 필요한 일이어서 섣불리 하기가 어려워요.


청계천에서는 기록해야할 대상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셨나요?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가 지금까지 3~4년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개인적으로 가까워 지려고 노렸을 많이 했어요. 이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재개발 때 주장하고 싶은 의견에 귀를 기울였고요. 청계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몸으로만 일을 하셨던 분들이니까 문서 작업이나 행정에 민원 제기하는 것 같은 일은 어려워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도와드리기도 하고, 같이 집회를 열기도 하면서 친해졌어요. 이분들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일을 통해서 관계를 맺은 거죠. 그러면서 가까워진 거리에서 이들의 생활을 관찰하고, 기록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오히려 기록을 못한 부분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마음만 먹으면 더 기록을 할 수 있었던 게 많았을 텐데, 집회나 행정적인 투쟁을 해야 되는 게 더 급한 일이어서 기록을 오히려 못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나중에는 페어링이나 국가도시건축박물관 같은 곳이 현장이랑 연계되는 역할을 하면서, 기록할 여력이 되시는 분이 기록하시게 관계를 만들고 연결시켜드리는 역할을 한 것도 있어요.
수집된 자료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해석하시나요?
수집된 것들을 급하게 박스에만 넣고, 컨테이너에 넣거나 어떤 공간에다가 놔둔 것들이 있어요. 모으는 게 기록 과정의 제일 앞 단계거든요. 그 다음부터 목록화하고, 맥락화하고, 공유하는 과정을 거칠 텐데요. 모아놓는 것까지는 했는데, 목록화와 맥락화는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 부채감 같은 게 있네요.
수집하는 과정 자체에도
관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 수집했던 것도 많은 것 중에 일부만 수집한 어떤 관점이 있었죠. 산업 연결망이 잘 보이는 자료들이 저에게는 일단 1순위였던 것 같아요. 그다음은 당시 일하는 공정 기술이 잘 드러나는 것이었어요. 근데 기술 측면에서도 오래된 기술을 썼던 기계들이나 지금은 많이 쓰지 않는 옛 도구들, 역사성 있는 것들을 수집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제 개인취향으로 예쁜 물건들이요.
분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기록학에서 얘기하는 기록의 형태별로 문서냐 박물이냐, 사진들도 있고, 현수막 같은 것들도 있고, 무겁지만 문짝이나 건축물의 부재 같은 것도 떼어온 게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형식별로 구분되는 것도 있고요. 주제별로는 공정별로 주물, 용접, 가공, 후가공... 이렇게 공정 순서대로도 나눠볼 수 있고요. 국가도시건축박물관이랑 조사할 때 한 블럭을 쪼갠 것도 분류 규칙이 될 수도 있어요. 건축물이 형성된 규칙에 따라 구분했던 것도 있거든요. 업종으로도 분류 체계를 잡을 수도 있어요. 제조업뿐만 아니라 음식점, 다방, 여성 종사자들, 세탁업... 이런 분들은 되게 소규모라서 소수라서 목소리를 많이 못 내셨어요. 이런 서비스업도 기록하려고 했는데 놓친 것도 있고요.
해석의 관점에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을까요?
해석의 면에서는 조금 더 연구자 분들이랑 연계해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여성이나 젠더 이슈로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고, 산업 생태계나 산업 재해 쪽에서 일하는 환경에 대해서 더 잘 아는 연구자들도 있거든요. 도시 측면에서는 도시 제조업을 오랫동안 연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주제별로 더 연구자들이 간 협업이 되면 더 깊고 풍성하게 해석될 수 있는 지점들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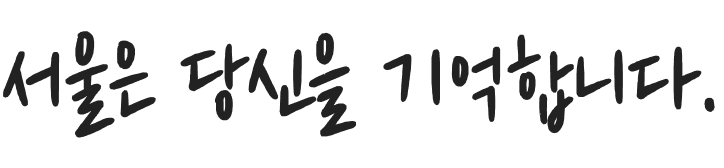
서울기록원의 노트
안근철 선생님의 인터뷰는, 현장에서 만들어진 기록이 오래 남기 위해서는 수집 이후의 정리와 보존까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서울기록원이 그동안 사본수집을 원칙으로 분산보관을 중요하게 여겨온 것도, 기록활동 주체가 자신의 기록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을 존중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록의 모든 과정이 기록활동가에게만 머무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서울기록원은 기록이 이어질 수 있는 구조와 협력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